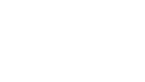- 감각의 기록
- 2024.05.22 ~ 2024.05.31

- 기간 : 2024.05.22 ~ 2024.05.31
- 장소 : 미술관
- 작가 : 이명아 김세일
- 작품개요
- 감각의 기록 展
이명아 김세일 -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즉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과 관측자의 상대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진 별자리의 모양이 변하지만, 관측자가 한 장소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 세이건, 홍승수 옮김,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 2006, p.392
우주의 별은 무리 지어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이다. 어떤 별은 주위 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나기도 하고 아예 다른 별자리로 편입되기도 하는데, 별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모든 별들의 움직임과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사람의 시간과 공간에서도 예외없이 ‘별자리’를 지키는 삶이 있다. 별자리는 바다의 등대처럼 그 자체로 빛남으로써 많은 이들을 비추고 지키고 이끈다. 늘 한 곳에서 조형을 사유해 온 김세일, 이명아 두 작가의 삶은 ‘별자리’를 떠오르게 한다. 대학에서 동료 교육자이자, 같은 시대를 관통하는 작가로서 각자의 예술을 응원해온 이들에게 ‘조형’은 말 그대로 ‘형(形)’을 만들어내는 일이자 동시에 삶의 여정으로 구축되었다. 30여년의 시간을 넘어 고유한 감각과 사유가 응축된 그들의 세계는 세상과 소통해온 혜안(慧眼)의 순간을 일깨운다.
김세일 작가는 나무 조각을 시작으로 철망, 브론즈, 무쇠, 석고 등으로 다양한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 석고를 이용한 <촉>, <벽> 등의 작업은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부조’와 ‘표면’에서 깊이와 결의 실험을 드러낸다. 1992년 첫 개인전 이후 현재까지 그의 작업은 양식적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체를 모티프로 한 형상적(figurative) 양상이고, 두 번째는 철망의 반복적 형태로 이어지는 확장적(expansive) 또는 구축적(constructive) 양상이다. 두 양상 모두 정형화되지 않은 물질과 형상으로 그의 삶에 대한 사유를 투영하고 있다. 그가 다루어온 철선은 보다 비정형적 반복으로 이어지는 사유의 실체이자 수행적 과정으로 독해되며, 상대적으로 윤곽과 양감을 가진 목조 인체 형상은 삶에 다가가는 무게와 진실한 태도를 엿보게 한다. 특히 철과 나무 등의 재료와 함께 그의 작업에서 재발견되는 석고는 형상이나 텍스쳐를 보다 섬세하게 드러내는 속성으로 부각된다. 석고에 대한 과정적 또는 매개적 질료로서의 특질을 작업에서 다각도로 실험하는데, 캔버스 가운데 오려내고 덧대거나, 그 자체로 질감이자 형상으로 두드러진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촉>, <벽>, <별>은 모두 2023년 제작된 것들로, 평면 위의 부조 혹은 입체이거나 간에 모두 인체의 형상적 특질을 드러낸다. <벽>이 평면 위에 깊이를 만들며 섬세한 양각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드러낸다면, <별>과 <촉>은 인체를 수직적 형상 또는 물질에 의한 거친 드로잉으로 완결한다. 가슴이 도려내진 <촉 2>와 같은 형상은 거친 내부이자 외부인 인간의 불안과 성찰을 한 눈에 보여준다.
이명아 작가는 도자를 기반으로 정서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평면을 만들어왔다. 1987년 첫개인전 이후 현재까지 작가의 작업에서 일관된 양상이라면 비대칭적 균형과 조화의 기하하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도자라는 매체를 기(器)가 아닌 평면과 오브제로 탐색해온 조형 태도의 일관됨을 말할 수 있다. 조형이라는 단어가 작가에겐 일상의 순간에서부터 도자의 질료로부터 아크릴 위의 드로잉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완결되기 때문이다. 1999년 4회 개인전에서 그의 작업은 평면을 이루는 건축의 골격과 같은 수직과 수평의 평면과 반복의 기하학적 형태를 완성한다. 작가의 오브제는 평평하지만 견고함과 반듯함이 있는 도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빌딩의 반복적이고 일률적인 형태의 간결한 형식미를 전한다. 모더니즘의 정신성을 관통한 작가의 이 같은 태도는 2014년 전시에서 색과 이질적 재료의 결합을 시도하며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도자로 시도된 선과 면의 레이어들이 흘러간 잡지의 파편과 사물 그리고 기하하적 형태가 하나의 평면에서 만나는데, 이는 작가의 시간을 통해 지나온 기억과 사유의 잔상이 오브제화된 것이다. 이처럼 작가의 솔직함이나 투명한 삶의 태도는 후기시대에 보다 선명해졌다. 자신의 사유를 기억과 손끝의 감각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장르적 경계를 너머 자유롭게 선명한 삶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시각 유닛에는 레고와 시디와 조화를 이루는 도자 오브제가 장면으로 이어진다. 연속적이면서도 분절적인 삶의 순간에 대한 기억의 풍경일지도 모르겠다.
동시대를 살아온 두 작가의 작업은 동시대를 각자 다른 조형을 드러내며 30여년의 시간을 지나왔다. 김세일 작가의 인체 형상에서나 이명아 작가의 시간과 기억의 단면에서나 모더니즘과 이후의 동시대 패러다임을 내면화하면서 독자적 조형을 위한 무수한 사고와 실험의 과정이 있었음을 목도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의 응축으로 별자리는 빛나는 것이다.
박남희(미술비평, 백남준아트센터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