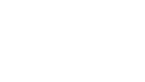- Good Form-울름조형대학과 브라운
- 2019.09.05 ~ 2019.10.11
- 기간 : 2019.09.05 ~ 2019.10.11
- 장소 : 미술관
- 작가 :
- 작품개요
- Good Form - 울름 조형대학과 브라운
-
본 전시는 울름조형대학과 브라운 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울름조형대학(1953-1968)은 정치적 중립인 바우하우스(Bauhaus, 1919-1933)의 기본이념을 계승하되 비판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사용목적에 합당하며 미적 사용에 문제가 없는 ‘Good Form’을 디자인하고자 노력하였다. 1950년,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던 브라운 사(1921-)는 울름조형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체결,‘좋은 생활양식’을 표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신즉물성을 따르는 브라운의 디자인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세계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끌었다. 이러한 디자인 개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울름조형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이룩한 디자인 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바우하우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시와 영화 등 바우하우스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지금, 이 전시는 실사구시를 이념으로 하는 본교의 모든 학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전시를 통해 ‘Good Form’에 대해 새롭게 음미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산학협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전시를 위해 흔쾌히 귀한 소장품을 제공해주신 강석호, 이병종, 이종명, 전병철, 정혜승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GOOD FORM
합리적으로 질서정연한 조화를 이루고 재료에 적합하며 보기에도 좋은 형태는
누구에게나 유쾌하고 활기차며 세련된 느낌을 전해준다.
부정직하고 거짓되며 추한 형태는 파괴적으로 작용하며 부조화를 조장한다.
- 요한네스 이텐 Johannes Itten, 막스 빌 Max Bill, 1949 –
울름조형대학과 브라운
제 2차 대전 이후 서유럽 사람들에게는 경제재건으로 시작된 미국식 소비사회가 희망찬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다. “소비가 곧 자유의 실현”이란 믿음이 퍼져나갔고, 소비만을 꾀하는 유행의 물결이 몰아쳤다. 미국의 유기적 디자인과 유선형 스타일링이 최신 유행으로 떠오르고 급속히 변화해 가는 한편,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소비자들 일상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이처럼 소비시장 중심의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자본주의 국가 지배체제가 다시금 부흥하면서 심각한 사회ㆍ환경 문제들이 야기되자,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랑스 구조주의 학파 이론을 토대로 신좌파 운동이 다방면으로 펼쳐져 나갔다.
당시 재건된 독일공작연맹에서는 1920/30년대 신즉물성의 전통에 따라 “좋은 형태(Gute Form, Good Form)”를 정의하고, 아이어만(E. Eiermann), 바겐펠트(W. Wagenfeld), 히르헤(H. Hirche) 등과 같은 신즉물성의 대표자들은 “좋은 형태”의 선도자로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좋은 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한 디자이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울름조형대학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브라운 사에게도 울름조형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생활양식”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21년 막스 브라운(Max Braun)이 설립한, 유럽을 대표하는 라디오 전문회사 브라운은 1947년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을 복구하여 손전등 마눌룩스(Manulux)의 재생산을 시작으로 라디오 및 전축 생산을 재기했고, 전기면도기 S50과 주방기기 물티믹스(Multimix) 등을 생산하면서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그 제품들은 당시 유행하던 1930년대 바로크 풍이나 아르데코 풍의 과시적 양식이나 스트림라인 스타일링을 따르고 있었다.
1950년 막스 브라운의 죽음으로 회사를 물려받은 에르빈(Erwin)과 아르투르(Artur) 브라운은 독일공작연맹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이흘러(F. Eichler)를 디자인 고문으로 모셔오고 울름조형대학과의 협동을 통해 “좋은 생활양식” 개발을 꾀했다. 그 결과들은 1955년 뒤셀도르프 전파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거기서 신즉물성을 따르는 브라운 디자인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 후, 브라운 사의 뮬러(G.A. Müller)와 람스(D. Rams)는 울름조형대학의 귀즐로(H. Gugelot)의 지도를 받으며, 특히 1958년 설립된 귀즐로 디자인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브라운의 “좋은 생활양식” 개발을 완성해 나갔다.
울름조형대학의 말도나도(T. Maldonado)와 귀즐로 등은 구성주의자 마이어(H. Meyer)의 바우하우스(1927-30)의 과학적 전통을 계승해 나갔다. 그래서 울름조형대학에서는 디자이너를 미술가가 아닌, 인본적 환경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즉 환경엔지니어(Umwelt-Ingenieur)로 정의하고 교육프로그램에 과학과목을 적극 도입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토대로 소비를 조장하는 스타일링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위적 폐기를 조장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유행을 극복하는 반시장자본주의 이상사회 환경 건설을 꾀했다. 그 결과, 바우하우스 50주년을 기념하던 1968년에, 바우하우스의 계승을 추구했던 울름조형대학 역시 바우하우스와 유사하게 폐교되었다.
서문: 이병종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교수)